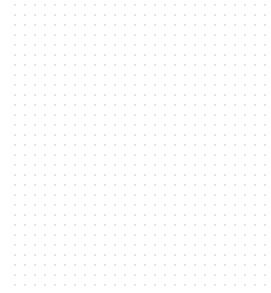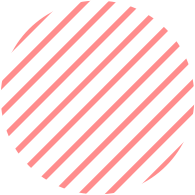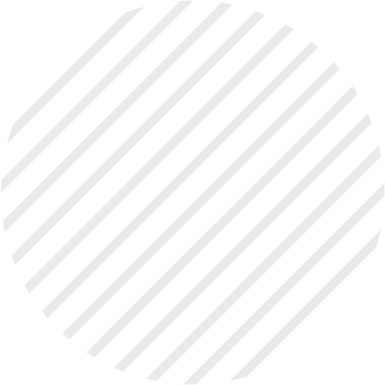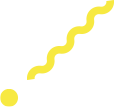-
-
장려상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
작. 조요섭
“우리의 정원은 부산 동구에 실재하는 곳이었지만, 꼭 실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었다.
꼭 그때여서가 아니고, 그곳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눴던 우리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예쁜 나날이자 열여섯의 작은
세상이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애써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기억 그 자체가 정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곳에서 한참을 너를 찾다가, 앞날의 나를 만난다. 함께 예뻤던 어제의 너와 나를, 그때의 우리를.”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자 학교에서는 ‘매칭’으로 우등생과 열등생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 학교가 부산 동구에서는 제법 선도 학교 축에 속해 있던 탓에 그 당시치고는 제법 선진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 2시간마다 우등생이 열등생을 일대일로 멘토링해서 멘토에게는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멘티 중 성적 상승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다. 학원을 가야 하는 녀석들을 빼고, 봉사 시간이 필요 없는 녀석들을 빼고 하다 보니 이성이긴 했지만 운명처럼 예외로 봄이와 내가 매칭이 되었다.
서로를 ‘예쁘고 잘난 애’와 ‘책만 읽는 조용한 놈’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던 우리는 그 2시간을 공부로만 채우기엔 아직 어렸고 여전히 아이였고 또 서로를 너무 몰랐다. 때문에 방과 후의 그 가을 교실은 공부를 핑계로 어느새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자유로운 성향의 멘토와 반강제식으로 매칭당한 멘티였던 다른 몇몇 녀석들이 상호 합의하에 교실에서 도망치는 일들이 생기자 봄이와 나만 그곳에 남아 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물리적 환경이 서로를 알게 되고 점차 작은 비밀을 하나둘 공유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다. 봄이로 인해 친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가지는 또 다른 결 하나가 바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다.
다른 시간에는 여전히 1학기 때처럼 서로를 모르는 듯이 지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그 2시간에는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일이 연속해서 이루어졌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웃기고 재밌는 것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가 더 많았지만 역설스럽게도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
한 가지 사실을 고치자면, 모든 수업을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다. 문학을 좋아했던 만큼 국어 시간만은 곧잘 참여했다. 다른 수업은 안 들어도 국어 수업은 잘 듣는다는 사실을 국어 선생님까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되어 수업 중 문학작품을 읽는 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게 됐다.
“아, 눈 아파. 이거, 읽고는 싶은데.”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다.
“난 눈 감고 좀 기대 있을래. 네가 좀 읽어주라. 너 잘하잖아. 읽는 거.”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작품을 읽었던 것은.
수상작 전문은 《이야기 공작소 부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