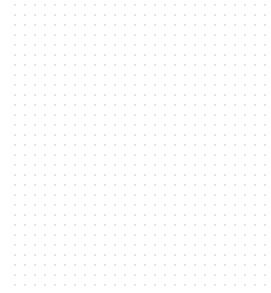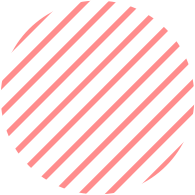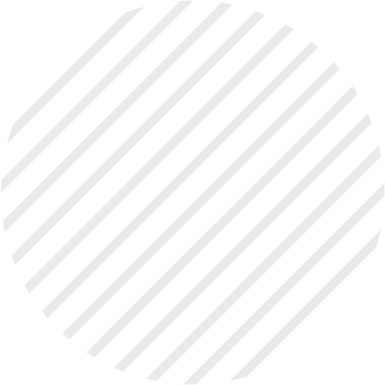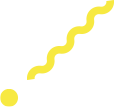-
-
우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내겐 작은 희망이었다
작. 김수현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웠을 그때 작은 희망이 되어주던 동구는 나의 열아홉과 스물과 스물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나의 아이들이 그때의 내 나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아이들에게 눈물 없이 엄마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마주할 용기가 생겨났을 어느 때에 꼭 한번 걸어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내겐 작은 희망이었으니까.”
나중에 다 커서 동생은 누나는 늘 돈가스 반찬이었다고, 도시락 싸고 조금 남은 것들 입맛 없는 아침 먹을 때 좀 줬으면 했는데, 숨겨 놨다 누나가 먹더라고 원망 섞인 소리를 했다. 엄마 뒷바라지만 받던 여고생이 할 수 있는 반찬이라곤 냉동식품이나 햄 사다가 구워 주는 것밖에는 할 줄 몰랐고, 그 남긴 돈가스 조각이 나도 먹고 싶었다, 다시 구워 먹으면 일주일치 도시락 반찬 걱정을 했어야 했다는 말을 어찌 너에게 건넬 수 있었을까.
나는 내색을 못 했다. 월세가 밀려 주인아주머니가 찾아오시면 엄마께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더 늦어지면 아주머니가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라고 소리쳐도 불 끄고 집에 없는 척 숨죽여 혼자 감당해야 했음을. 이층 방에 사는 젊은 아저씨가 없을 때만 옥상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었던 걸. 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큰길까지는 늘 종종걸음을 하던 나를 알아 달라 할 수 없었다.
그런 동구의 기억 속에서도 단 둘이어서 더 끈끈해진 남매의 우애도 있었고, 부모와 떨어져 지내 더 깊어진 은혜도 있었다. 잃은 게 더 많았던 우리였지만, 그 틈새로 좋은 사람을 걸러낼 안목도 생겼다. 상처받아도 털고 일어날 내공도 생겼다.
동구에 살던 땐 위로 가는 계단을 단 한 번도 끝까지 올라본 적이 없다. 늘 종종걸음으로 올라가 한 번 만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아 잠그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볼일이 생겨 단 한 번 올라본 계단 끝 꼭대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고, 가슴이 그렇게 트인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기억이 있다. 색색 초라한 지붕들만 빼곡히 내려다보이던 꼭대기.
나에게 ‘부산’과 ‘동구’는 혹여나 잘못 건드려 곪아 터질까 두려워서 감히 열지 못하는 자물쇠 잠긴 일기장과도 같은 곳이다. 그리울 대로 그리워져 선명해지다 흐려지는 그런 곳이다. 심장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감히 추억이랍시고 함부로 들춰내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다.
이제는 용기를 조금 내보아도 되지 않을까.
수상작 전문은 《이야기 공작소 부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