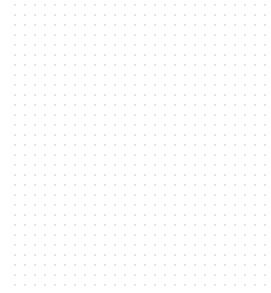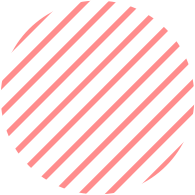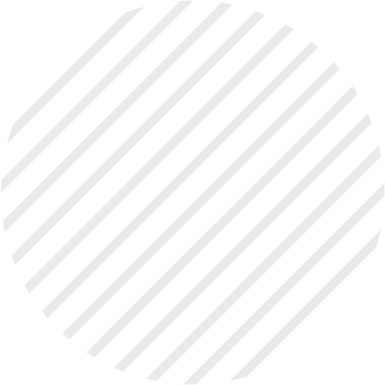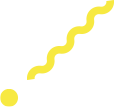-
-
우수상
초량동, 우리 인생의 ‘이바구길’을 돌아보며
작. 김솔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짚으며 올라가듯 하루는 쌓여 일 년이 되고 일 년은 쌓여 십 년이 된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168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번 돈으로 좋은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세 자식들을 키워냈고 공부를 시켰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치열한 삶의 터전은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로 가득 찬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엄마가 나와 함께 당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초량동이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 초량동의 산복도로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산 밑으로 빼곡하게 내려다보이는 낮은 주택들과 상반되는 분위기의 대형 신상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한잔했다. 엄마가 살았다던 동네는 그곳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을, 구석진 골목이었다.
부산역에 내려 20분가량을 천천히 걸어 ‘이바구길’이라는 테마 거리 입구에 이르렀다. “여기도 많이 변했네.” 엄마의 첫마디였다. 이바구는 ‘입’과 ‘아구’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이바구길이라는 이름답게 눈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은 한국 근대사의 산물이었다. 역사는 이야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산복도로까지 올라가는 168계단은 부산역 근처의 산 아랫동네와 산복도로의 산 윗동네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평균 경사가 37도에 달하는 계단으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찰 지경이지만, 지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개통되어 관광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었다. 엄마는 계단을 걷고 싶어 했다. 무리일 것 같았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몇 계단을 오르고 잠깐 섰다가, 또 몇 계단을 오르고 잠깐 섰다. 계단의 초입에는 알록달록한 주택 모양 장식물이 붙어 있었다. 마치 이 장식물에 꼭 들어맞을 만큼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맨몸에 미싱(재봉틀) 하나 들고 피란 온 할머니는 부산에 자리를 잡고 깡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세 남매를 먹여 살렸다. 초량동 판자촌에 살던 세 아이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돌아가는 엄마의 미싱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168계단 언저리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있었을 것이다. 지친 어깨를 이끌고 계단을 오르는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졸려서 감기우던 눈도 반짝였을 것이다. “달동네를 왜 달동네라고 하는지 아니? 달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야.” 이름에 붙은 낭만적인 유래와는 달리 이 시절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가족 간의 사랑과 끈끈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처절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상작 전문은 《이야기 공작소 부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